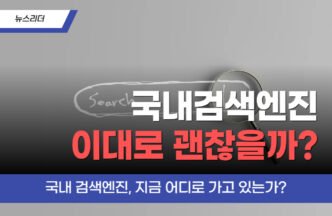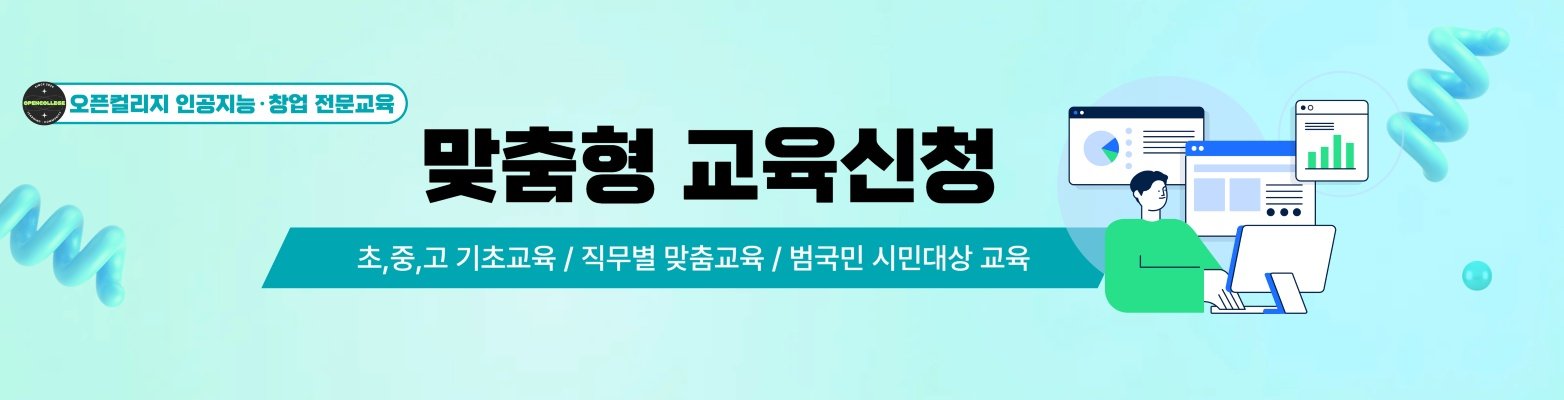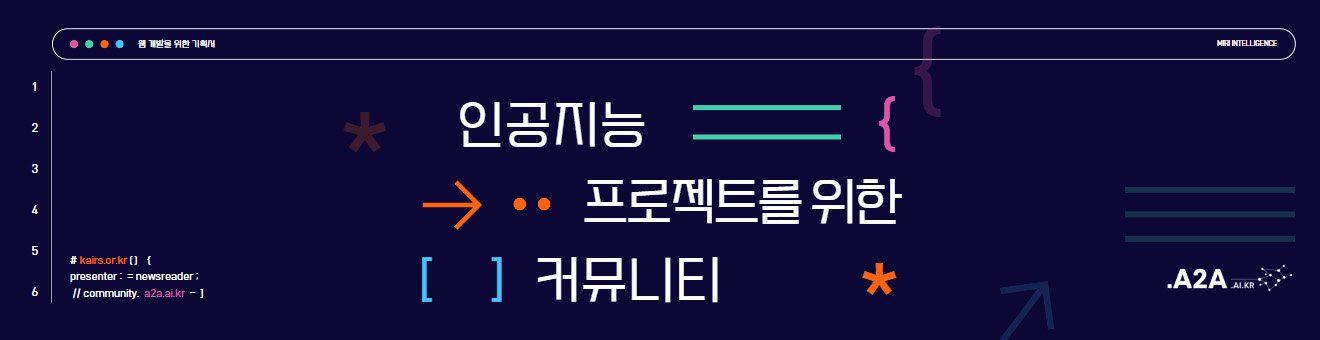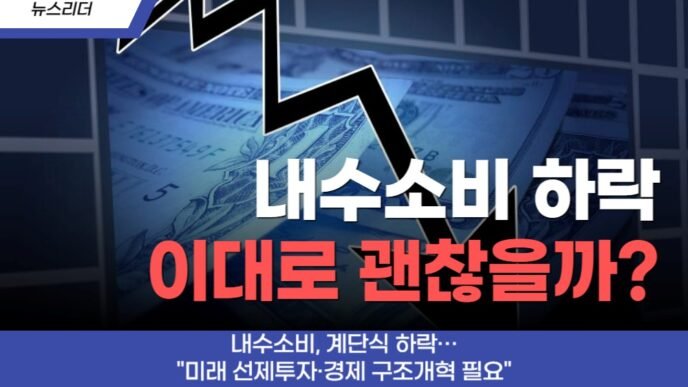네이버는 외부 세계를 차단하고 내부 콘텐츠위주로 검색 본질을 잃어버렸다.
광고성 콘텐츠 범람으로 사용자가 진짜 정보를 찾기 어려워 지면서 사용자의 신뢰를 잃었다.
- 한 시대를 풍미했던 다음(Daum), 사실상 대중적 영향력 상실
- 네이버(Naver)도 ‘검색’보다 ‘쇼핑·콘텐츠’로 방향 전환
- 구글 중심의 검색 이용 증가, 국내 시장 변화 가속
- 검색 엔진이라는 ‘본질’이 사라질 때, 한국 인터넷 생태계는 무엇을 잃게 될까
2000년대 초반, 국내 인터넷을 말할 때 ‘다음’과 ‘네이버’는 그 자체였다. 사람들이 모이고, 정보를 찾고, 세상을 읽어내던 창구였다. 그러나 2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존재감은 너무도 달라졌다.
다음(Daum)은 ‘사라진 존재’에 가깝다.
카카오와 합병 이후, 다음은 사실상 카카오의 하위 서비스로 전락했다. 과거를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향수일 뿐, 새로운 세대에겐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됐다.
실제 트래픽 수치를 보면 다음의 검색 점유율은 2% 남짓에 불과하다. 과거 ‘메일은 다음, 카페는 다음’이라는 구호는 이젠 박물관 속 기록이 됐다.
그렇다면 네이버는 어떨까?
‘국민 포털’이라 불리던 네이버는 살아남았다. 그러나 문제는 생존 방식이다. 네이버는 더 이상 ‘검색엔진’에 집중하지 않는다. 검색창을 열면 정보보다 쇼핑몰이 먼저다. 뉴스보다 광고성 콘텐츠가 더 눈에 띈다.
‘검색’이 본업이었지만, 지금 네이버의 핵심 수익원은 쇼핑, 커머스, 구독 서비스다. 이 변화는 자연스럽지만, 동시에 섬뜩하다.
“우리는 정보를 찾기 위해 포털을 방문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사거나 결제하기 위해 방문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는 네이버의 ‘폐쇄성’이다.
네이버는 외부 웹페이지보다 자사 플랫폼인 블로그와 카페 글을 우선 노출한다. 검색 결과의 상당 부분이 네이버 내부 콘텐츠로 채워져 있다. 블로그, 카페, 지식인 등 ‘닫힌 생태계’ 안에서만 정보를 소비하게 만든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다양한 시각과 외부 전문 정보를 접하기 어려워졌다. 결과적으로 ‘검색’이 아니라 ‘편향된 안내’에 가깝게 변질됐다.
더욱이, 네이버 검색 결과 상단은 광고가 가득하다.
‘광고’ 표시가 되어있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광고와 쇼핑정보로 인해 “진짜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선 스크롤을 수없이 내려야 한다.
공익적 가치보다 수익성이 우선되면서, 정보 탐색 과정이 왜곡되고 피로해진 것이다.
사용자는 이미 움직였다.
구글 검색 점유율은 국내에서 2024년 기준 약 40%를 넘어섰다. 특히 젊은 세대, 전문가 집단에서는 구글이 ‘당연한 기본’이 됐다. 유튜브 검색을 통한 정보 탐색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검색의 본질이 텍스트 중심에서 영상 중심으로 바뀌면서, 네이버는 점점 더 구시대 유물처럼 느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남는다.
구글은 글로벌 기업이다. ‘국내 맞춤형’ 검색, ‘지역 커뮤니티’ 중심 정보는 여전히 공백이 존재한다. 네이버가 초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인의 생활 깊숙이 파고든 지역성, 생활밀착형 정보 덕분이었다. 그런데 지금 네이버는 그 강점을 버리고, 돈 되는 영역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는 결국 ‘공공성의 위기’로 이어진다.
검색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다. 사회의 정보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프라다. 특정 정보가 묻히거나, 광고에 가려진다면? 사용자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기회를 잃는다. 인터넷의 민주성도, 공정성도 무너진다.